
‘요즘은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라고들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변한 데는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 그렇지”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다.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 불확실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
유행하는 소설이나 웹툰, 드라마에서처럼 과거로 돌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현재는 어렵고 불확실한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니 ‘불확실한 현재’라는 건 사람들을 부정적, 비관적으로 만든 원인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유명한 옛 이야기인 ‘맹모삼천지교’에서도 다뤄진 것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뉴스가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낙관적인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 대중심리학 매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 최근 ‘불확실한 시대의 낙관적 태도’를 주제로 게재했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한다.
‘어그로’가 더 많은 관심을 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모습과 딴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필요한 영역이자 ‘학술적 연구’의 영역이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분명한 현상 하나는 짚어볼 수 있겠다. 바로 ‘부정적 행동(negative)’이 더 관심을 끌기 쉽다는 것이다.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무례한 언행’,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어그로’를 끄는 행위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쉽다는 이야기다.
한 예로, 캐나다 위니펙 대학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의회 의원들이 게시한 SNS 게시물을 분석한 적이 있다. 의원들이 작성한 게시물 중, 타인을 칭찬하는 내용보다 무례한 표현을 쓴 내용이 더 많은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이와 비슷한 작업을 2021년 뉴욕 대학에서도 진행한 바 있다. 270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과 엑스(과거 트위터)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 성향의 메시지보다 2배 이상 더 자주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온라인 매너’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강해진 경향도 분명 있다. 다양한 경로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호 예의’를 기본 공식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채널, 콘텐츠에 따라다니는 댓글창 등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눈에 띌 때가 많다. 어그로를 끄는 방식도 다양해서, 까딱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들기도 한다. 오죽하면 ‘어그로에 관심을 주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돌아다닐까.
부정적 뉴스가 눈에 잘 띈다
그렇다면 뉴스는 어떨까?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는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 없다. 답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뉴스가 긍정적 뉴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인간의 공통적 성향이다. 인간은 위험요소, 혹은 사건사고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게 해가 될지 모를 요소를 경계하며,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뉴스의 생산 환경 변화가 더해졌다. 뉴스 공급 채널이 수없이 많아진 요즘이다. 과거에는 몇 개의 지정된 미디어가 공신력을 차지하고 뉴스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터넷 신문, 유튜브 채널 등을 포함해 무수한 경로로 소식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간다. 그 와중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도 성행한다.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 중세 봉건시대가 따로 없다.
뉴스 생산자인 미디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자극적인 제목은 거의 필수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 공격적인 멘트 등이 들어가면 홀린 듯 클릭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사람들의 대화는 어떨까? 친구들을 만나서 근황을 주고받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부정적인 뉴스 내용, 자신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건사고나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른바 ‘뒷담화’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즉, 부정적 뉴스는 정보 전달에 더해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뉴스 채널 속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해 의식하지 않고 있던 자신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요즘이다. 당신의 유튜브, 뉴스 채널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라.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그럼에도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
온갖 부정적인 현상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해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라는 자조적 농담을 주고받는 일이 있음에도, 낙관적 태도를 가질 이유는 분명 있다.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다. 긍정적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개인적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낙관적 현실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2015년 발표된 적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질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심리적 회복력 또한 뛰어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발표됐다.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 수준이 낮았다는 내용이다. 그 누구도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낙관적 태도가 정신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누가 봐도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낙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는 미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약 10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조직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현실을 약 10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보라고 이야기한다.
해당 기고를 작성한 이탈리아 루이스 비즈니스 스쿨의 리더십 분야 부교수 앤서니 실라드 박사는 2022년 4월 「노동경제학 저널(Labor Economics)」에 실린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자녀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현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실라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기고를 마무리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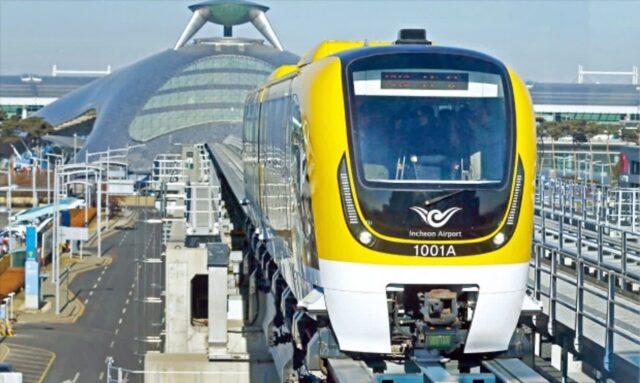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