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지휘체계가 고도와 구역에 따라 공군과 육군으로 분리되어 있다. 공중 위협에 대해서는 공군이, 지상과 저고도 위협에는 육군이 대응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명확한 책임 주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상황 인식과 대응 속도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통합된 방공 지휘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다. 국가 전력의 운영 효율성과 대응 능력은 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초기 요격 역량 부재로 위협 사전 제거 불가
KAMD는 요격이 가장 어려운 종말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사일이 대기권 내로 재진입하는 하층 단계는 요격 성공 확률이 가장 낮은 구간이다. 반면 상승 단계나 중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경우, 방어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초기 단계 요격 역량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장 마지막 수단에 의존하는 방어 전략만 고수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위협을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다.

미국 MD와 연계 부족, 다층 방어 취약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의 연계가 필수다. 현재 SM-3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휘체계 통합 등 근본적인 연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탐지, 식별, 요격 결정 등 전체 방공 프로세스를 한국 단독으로 완결할 수 없으면 미국과의 실시간 협력도 어렵다.이는 다층방어 체계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과의 공동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체계 통합은 시급한 과제다.

선제 타격과 다층 방어의 병행 전략 절실
북한의 무력 위협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정밀 타격 로켓, 활강형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 기동이 가능한 유도 무기 등 전례 없는 위협이 출현 중이다. 이런 복합적 위협에는 요격 중심의 수동적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입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다층적 요격 체계 강화, 레이더 탐지 및 위성 기반 추적 기술 확보, 정보 공유 및 연합 작전 강화 등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한국형 방공 전략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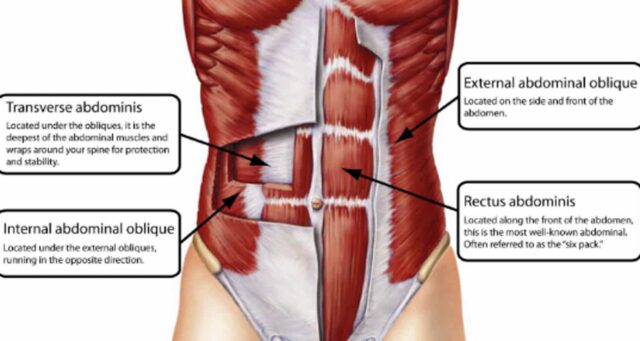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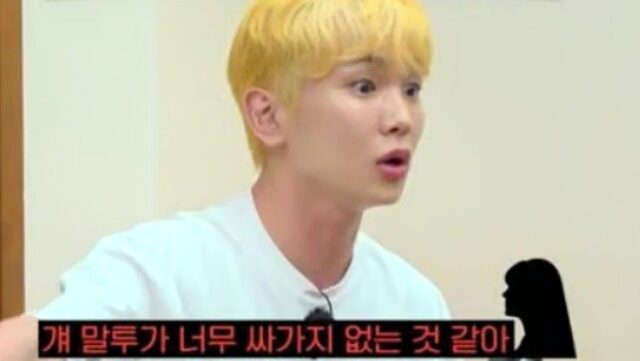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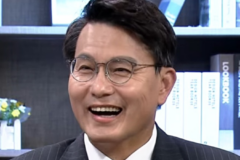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