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 1분 24초 만에 시작된 비극
1999년 9월 14일,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가 정상적으로 이륙한 직후, 좌측 엔진에서 회전수 저하와 배기가스 온도 이상이 감지됐다. 상황은 곧 전파됐고 지휘부는 귀환 지시를 내렸지만, 이어 우측 엔진까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기체는 하강을 시작했다. F-5는 쌍발 엔진 항공기로,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제한적 귀환이 가능하지만 양쪽 모두 정지한 상태에선 비행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원인, ‘물’이 섞인 연료
사고 이후 조사 결과,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에 주입된 것은 항공유가 아닌 ‘지하수’였다. 약 500배럴 분량의 지하수가 연료와 함께 연료탱크에 섞여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오래전 시공된 6번 연료탱크의 방수 미비와 구조적 결함이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였다. 탱크 하부에 생긴 균열로 수년간 지하수가 유입됐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일부 장교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했다.

시스템 전반의 실패… 이중 안전장치조차 작동 불능
연료에 혼입된 수분은 연료 공급 장비의 수분 감지 차단 밸브와 연료 여과기 등을 통해 걸러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장치는 수년간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정비 지연과 부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이 지속되었다. 결국, 연료에 섞인 맹물이 전투기에 그대로 주입되며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했다.

조작된 검열 보고와 형식적 점검
당시 연료탱크의 주기적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탱크에 남아 있던 지하수 혼입 사실은 중대 단위에서 축소되었고, 연료 샘플은 조작되어 제출됐다. 검열을 담당한 군수 사령부는 이를 문제 없이 통과시켰고, 이후 해당 탱크의 사용이 계속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책임자는 지하수 혼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식 보고를 피하고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무사안일주의, 작은 방심이 불러온 참사
연료 주입 전에는 반드시 샘플을 채취해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샘플 채취통이 불투명한 재질이었고, 최근 검열 통과에 대한 안일한 신뢰가 더해져 실질적인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하수가 가득 섞인 연료가 주유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놓쳐졌다.

조종사의 선택, 민가를 살리고 자신을 잃다
전투기는 이륙 직후 좌·우 엔진 모두가 정지하며 하강했다. 후방 조종사는 사출에 성공했지만, 전방 조종사 박정수 대위는 민가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전투기의 사출 좌석은 고도 1.9도 이하에선 작동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박 대위는 기체와 함께 순직했다. 그의 희생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뒤늦은 조사… 곳곳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
사고 후 국방부는 전국 비행단의 연료탱크를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예천뿐 아니라 수원, 청주, 강릉, 광주 등지에서도 유사한 결함과 균열, 수분 감지기 고장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문제는 예천 기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연료 보급 체계 전반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대규모 문책과 규정 개편
국방부는 전투비행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보급대 간부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 모든 항공기의 연료는 비행 전마다 수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었다. 정비 매뉴얼도 대폭 개정되며 후속 조치가 뒤따랐다.

10년이 지나서야 바뀐 사출 좌석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였던 전투기의 사출 좌석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방치되었다. 이후 F-5 전투기에서 여러 차례 유사 사고가 발생했고, 13명의 조종사가 추가로 순직한 뒤에야 사출 좌석 전면 교체가 이루어졌다. 어떤 고도나 속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신형 좌석은 2012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다.

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 조직의 책임감과 문화
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보고 체계의 무력화, 정비 불이행, 안전 장비 방치 등 조직 문화와 인식 부재가 합쳐져 참사를 초래했다. 공군의 책임 의식과 시스템이 재정비되지 않는 한,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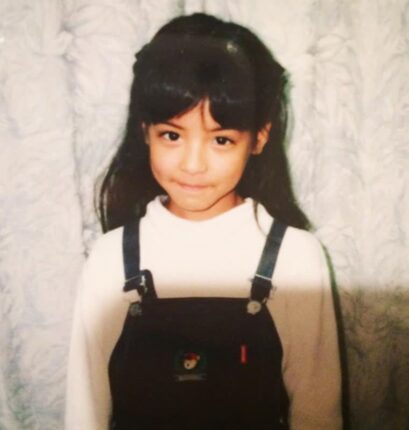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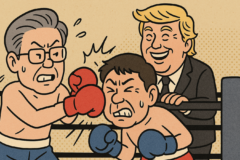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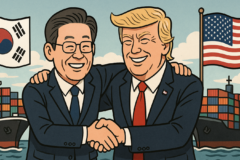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