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7, 국산 9㎜ 소음기관단총의 탄생 배경
1990년대 후반, 국내 특수부대는 은밀 침투 및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독일 MP5SD6 같은 소음기관단총이 필요했다.
하지만 높은 외제 수입 비용과 정비·부품 문제로 인해, 국산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1998년부터 국방품질관리소와 대우통신(現 SNT Motiv)이 공동 개발에 착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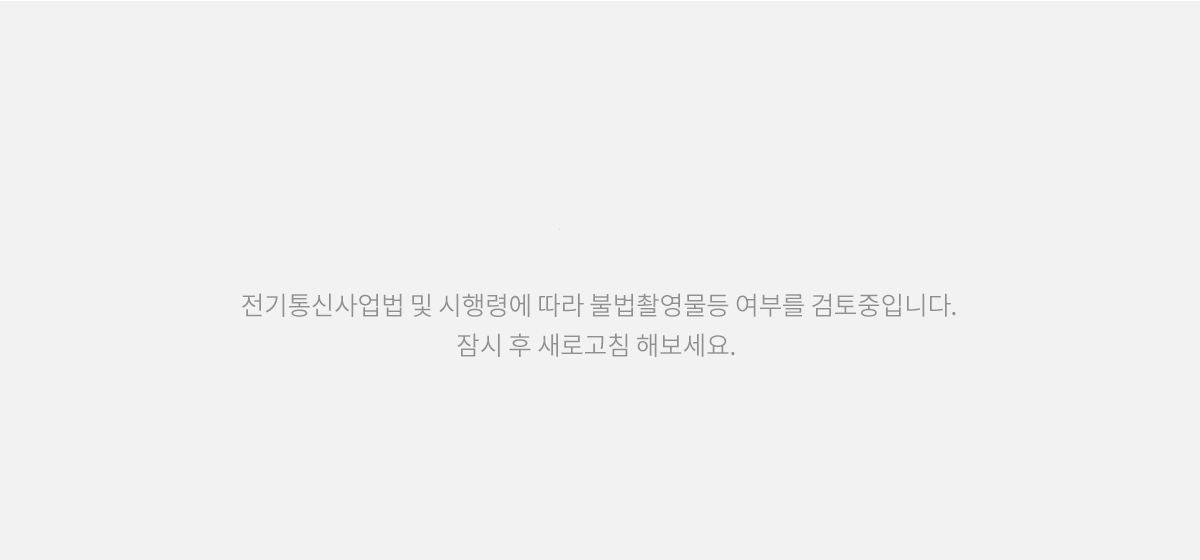
설계 특징 – 일체형 소음기와 블로우백 방식
K‑7의 핵심은 총열 일체형 소음기로,
- 30여 개의 통기구가 있는 벌집 구조
- 발사 소음을 120dB 이하로 억제하며,
- 총 길이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다.
또한, 작동 방식은 단순한 블로우백 방식을 채택해 신뢰성과 정비성이 우수하며,
K1계열 부품을 일부 공유해 정비 유연성도 확보했다.

성능 지표 – 근접전·은신 작전 특화
제원상 K‑7은
- 무게 약 3.4kg, 길이 788mm
- 분당 발사속도 1,100발, 유효사거리 100m
이내로 근접 교전에서 뛰어난 효율을 자랑한다.
실사격 결과
- 20~50m 거리에서 100% 명중
- 100m 유효사거리에서도 90% 수준 정확도
라며 도심·실내 내 은밀 제압에 최적화됨이 확인되었다.

오직 특수부대 전용 – 왜 일반군은 안 쓰는가?
K‑7은 육군특전사, 해군특전전단(UDT/SEAL) 등 정예 특수부대 전용으로 개발돼 일반 보병부대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이유는
- 단거리 특화 → 보병 교전엔 사거리 제약
- 고가·고정밀 소음 시스템 → 일반 훈련시 과도한 비용
- 정비·운용 체계 복잡 → 일반군 조직에는 부담
등으로, 전투용이 아닌 특임작전을 위한 전용무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왜 특전사만 쓰는가 – 은밀 작전에 최적화된 기능성
특전사 요원들은
- 은밀 침투 시 적에게 잘 들리지 않도록 은닉성 필수,
- 근접전 위협 시 정확 제압 능력 우선하며,
- 거친 야지·해상 환경에서도 신뢰성 유지돼야 한다.
이에 K‑7은
- MP5SD6보다 저렴하면서,
- 진흙·해수·저온 환경에서도 신뢰도 우수,
- 부품 호환성으로 인한 정비 편의성 등이 크게 작용한다.
특전사 한 관계자는 “소음은 은폐, 근접 제압은 목표 차단에 필수”라며 K‑7의 운용 가치를 강조했다.

운용 부대 – 대한민국 특수전 핵심 자산
주요 운용 부대는 다음과 같다:
- 육군 특전사령부(레인저·대테러·침투 작전)
- 해군 특전전단(UDT/SEAL)
- 일부 경찰·해외 특수부대도 제한 운용
이외 국외 수출 포함, 인니 COPASSUS, 방글라데시 SWADS, 이란 대통령 경호대 등도 운용 중이다.

유지보수 및 내구성 – 반영구급 신뢰 구조
K‑7 소음기관은
- 공식 수명 2,000발,
- 실 야전 테스트 6,000발 이후에도 성능 유지.
이는 한국 내 장기 운용은 물론, 해외 실전 배치에도 적합한 내구성으로
한 번 채택 후 안정적 지속 사용 가능한 구조적 강점이다.

한계와 단점 – 구조·확장성 제약 존재
단점으로는
- 유효사거리 짧아 일반 교전은 불리하고
- 소음기 일체형 구조로 무게 증가,
- 발열로 인한 소음기 수명 제한,
- 레이일 확장성 부족 등이 지적된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특수작전 맥락에서는 수용 가능한 트레이드오프이며,
사실상 특전사 요구를 만족시키는 구조라는 평가다.

국산화의 상징 – 외산을 넘어 국내 개발의 자신감
K‑7은
- MP5SD6 대비 국산 저가화 실현,
- 부품 호환·정비 편의성 확보,
- 국내 산업 기술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잡았다.
특히 방산 자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산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경제·전략적 의미도 있다.

K‑7, 대한민국 특전사의 자기방어선
K‑7은 단순한 총이 아니라,
- 은폐와 제압을 동시에 구현한 특수임무 핵심 장비,
- 국산화 성공으로 방산 자립의 상징,
- 근접전 위주의 특수작전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일반군이 아닌 특전사·UDT/SEAL만 운용하는 이유는
“일반 교전용이 아닌, 은밀·근접 특임 작전을 위한 정예병기”이기 때문이다.
K‑7은 앞으로도 한국 특수부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며,
국산 무기 체계 전략적 중요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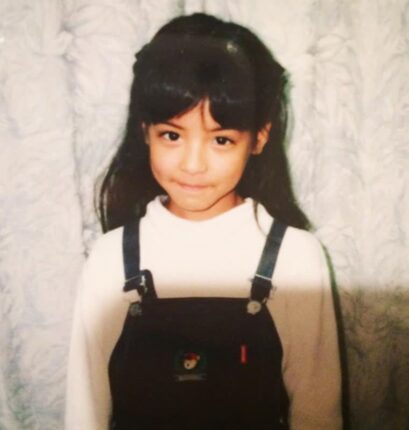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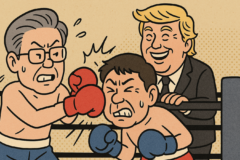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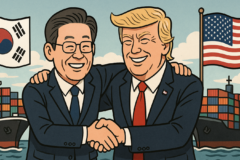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