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골(白骨)’ 상징에 담긴 불굴의 투지
3사단으로도 알려진 백골부대는 강원도 철원 DMZ에 주둔하며, 이름인 백골(白骨)은 ‘백골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사투 의지를 담고 있다.
극한의 추위—겨울에는 체감 기온 –30℃ 이하— 속에서도 훈련과 경계를 멈추지 않아, 군필자 사이에서도 “백골이 출동하면 입이 딱 다문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38선 돌파의 선봉, 한국전쟁의 역사적 순간
1950년 6·25 전쟁 당시 백골부대는 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이어진 한강방어선 전투에서 북진하는 북한군의 진격을 6일간 지연시켜 미국 참전 시간을 확보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전통의 강한 부대다.

DMZ 상시 경계,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는 완벽 작전력
6·25 전쟁 후에도 백골부대는 DMZ 포병 작전에 주력하며, **단 한 번도 북한의 기습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작전부대’**의 위용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도발 시도는 170여 회에 이르고, 이 중 일부를 격파하며 전방 경계와 보복 포격에 탁월함을 입증했다.

1973년 3·7 작전, GP 공격 응징의 전설
1973년 3월 7일, DMZ 중대장의 북한 GP 총격 도발에 대응하여 백골포병 대대는 즉시 155mm·105mm 곡사포로 GP를 초토화했다.
당시 북한 군관 유대윤 소위의 귀순 진술에 따르면, GP 안의 북한군 29명이 전원 사망했고, 북한은 백골부대를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박정인 장군의 단호한 지휘, 야간 경고 작전의 전설
당시 백골사단장 박정인 장군은 전 차량을 헤드라이트 점등하여 DMZ까지 진격시키는 위압적 경고 작전을 지시했고, 이 모습은 북한이 즉각 비상 동원령을 내리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과감한 지휘력과 실행력은 백골부대를 ‘전설의 부대’로 각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DMZ 감시 최전선,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비태세
철원 DMZ 전방에는 백골부대의 상징인 하얀 해골 문양이 군사 시설 곳곳에 새겨져 있다.
열화상·CCTV·레이더 등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추고 상시 병력 순찰과 보복 대응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DMZ 내 북한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감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계자’, DMZ 지속작전의 중심
백골부대는 1966~1969년 ‘조용한 전쟁’ 기간에도 미국·한국 연합부대와 함께 강력한 경계망을 수행했다. 특히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 이후에도 유형무형 억지 작전을 시험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실전 대비의 아이콘’ 역할을 해 왔다.

백골부대, 평화 낭만 뒤 숨은 실체
- ‘백골’이라는 이름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 한국전쟁 당시 전선 돌파와 한강 방어의 역사적 승리,
- DMZ 내 3·7 작전, 박정인 장군의 야간 위압 행동은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 북한 군사에게 ‘가장 두려운 부대’라는 인식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철저한 대비태세와 실전 대응 능력이 만든 현실이다.
백골부대는 전통과 실전을 통해 ‘평화를 위한 사수’의 상징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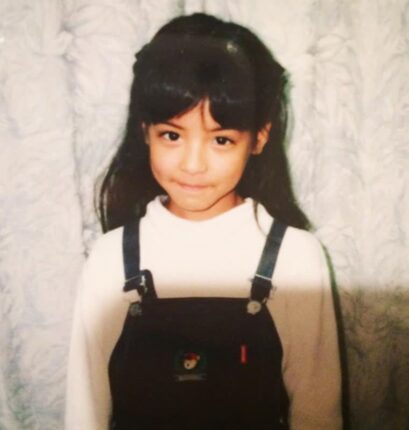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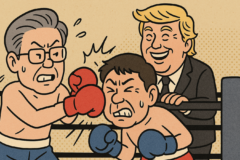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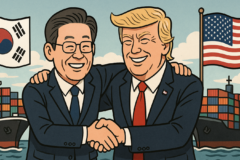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