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메뉴 중 하나가 카레다.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대량 조리도 가능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정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카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판 카레 고형 루라는 재료에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이 고형 카레에는 암과 연관될 수 있는 성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건강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형 카레는 ‘카레 맛’을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첨가물, 농축유지, 전분계 강화제를 사용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로 변질되거나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시판 카레 고형 루의 4가지 위험성과 그것이 ‘암덩어리’라 불릴 만한 이유를 정리해본다.

1. 팜유를 기반으로 한 고형 유지, 고온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발생
대부분의 시판 카레 블록에는 팜유 또는 쇼트닝이 주성분으로 들어간다. 이들 유지 성분은 고형 형태를 유지하고, 조리 시 부드러운 점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첨가된다. 하지만 문제는 팜유와 같은 포화지방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특히 튀김이나 볶음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명확히 인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위장관계 암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고형 카레 블록은 자체적으로 이미 열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리할 경우 중복 가열로 인해 발암물질이 더욱 다량 생성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시판 고형 카레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2. 인공 향신료 및 착향제, 간 효소계 과부하 유발
카레 특유의 향을 구현하기 위해, 시판 제품에는 커큐민 외에도 다양한 인공 향신료와 착향 화합물이 첨가된다. 특히 에틸바닐린, 메틸살리실레이트 등은 자연 유래가 아닌 합성 계열로, 장기적으로 간의 해독 효소계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 이들은 체내에서 사이토크롬 P450 계열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성 중간대사물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간세포 내 염증 반응이 유도된다.
일반적인 식사에서 소량 섭취될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시판 카레 특유의 중독성 있는 맛 때문이다. 일주일에 2~3회 이상 이 재료가 반복적으로 섭취되면 간 기능 이상, 만성 피로, 체내 독소 축적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 해독 효율이 떨어져 장기적인 간 손상 위험이 있다.

3. 밀가루와 전분 기반의 점도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
고형 카레의 부드러운 점도는 주로 밀가루, 타피오카 전분, 감자전분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점도제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고혈당 식재료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백미보다도 높은 당지수(GI)를 가지며, 특히 고형 카레는 밥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혈당 피크를 가파르게 만든다.
이런 구조는 반복적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뇨 전단계로만 끝나지 않는다. 고인슐린 혈증은 특정 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의 주요 촉진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고형 카레는 단순히 고칼로리 식품이 아니라, 체내 대사계 이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4. 발색제와 보존제, 장내세균총 교란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고형 카레에 흔히 첨가되는 보존제와 색소 성분이다. 일부 제품에는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 계열, 혹은 나트륨계 방부제가 포함되며, 이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장 내 유익균의 비율을 급격히 낮추고, 염증성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장내 환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 호르몬 대사, 독소 해독까지 관여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암세포의 성장 억제 능력 역시 현저히 떨어지며, 면역 회피 기전이 활성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장암, 직장암의 초기 원인 중 상당수가 장내세균총 교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공 첨가물의 장기 섭취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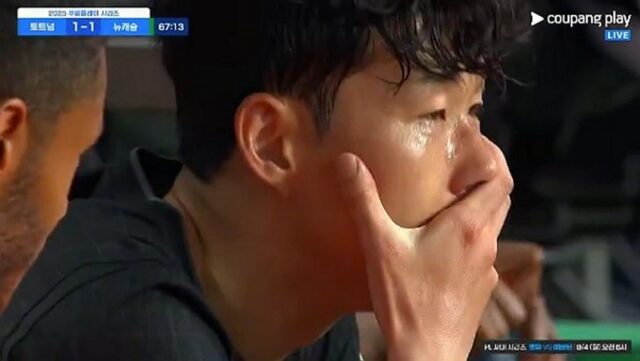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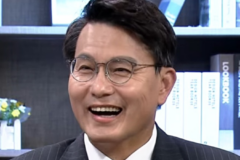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