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북파 작전, 금성천 넘어 첫걸음
1967년 9월 27일,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진삼은 특공부대원 3명과 함께 황해도 개풍군 금성천 부근으로 비밀리에 침투했다. 이들은 북한군 복장을 착용하고 철저히 은폐 행동에 들어갔다. 24시간 가까이 은신하며 지뢰를 매설하고 방공호에 머물던 이들은, 첫 교전에서 북한군 13명을 표적으로 정확히 사살한 뒤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선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진삼 대위 본인과 군사 기밀 문서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번째 침투, 대대장 제거 미수
첫 번째 성공 이후 약 2주 지나 10월 14일에 이진삼 대위는 동일 루트를 따라 재차 침투했으나, 현지 경계가 강화된 탓에 목표 대대장 제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남한이 북쪽의 반복적 도발에 대응하여 직접 보복 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남았다.

세 번째 작전, GP 기습으로 20명 추가 사살
1967년 10월 18일, 이진삼 대위는 침투 경로를 변경해 강원도→경기도 임진강 루트를 택했다. 689 GP를 급습한 이 작전에서 수류탄을 8발 던져 추가로 2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GP의 군사 장비 50여 점을 파괴했다. 이 역시 단 한 건의 사상 없이 완수됐다.
총 세 차례 작전으로 이진삼 대위와 특공대는 북한군 33명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희 대통령, 직접 금일봉 수여
이 작전의 성공은 최고 지도부까지 보고되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진삼 대위에게 금일봉을 수여하며 “국가를 위한 용감한 결단이었다”고 치하했다. 이진삼 대위는 이후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북파 공작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전설적 보복 작전’의 의미와 파장
이 작전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국경을 넘어 직접적 보복 행동을 실천한 드문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적으며, 당시 군사기밀이었지만 후일 공개된 문서와 본인 증언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2008년 국방위에서 관련 기밀 문서 일부가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작전은 북한의 도발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더 큰 도발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석 달 뒤 1968년 1월 21일에는 청와대 근방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이진삼 대위, 전향 공비도 이끌던 특공 지도자
이진삼 대위는 북파작전 외에도 여러 간첩 저지 및 응징 작전에 참여했다. 특유의 실전 무술 훈련과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정치에 진출해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스스로 “작지만 매운 고추”라 표현되었고, 실제 현장 지휘와 특공술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역사적 교훈과 안보 전략의 의미
- 단순 응징이 아닌 전략적 메시지
비밀리에 실행된 작전이었지만, 당시 북한 내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 - 상시적인 북침 작전 가능성 있었다는 사실
한국군의 기능적 준비와 실행 능력은 북한이 예상보다 훨씬 진전된 수준이었다. - 급변 가능성과 남북관계의 복잡성
보복 이후 발생한 청와대 침투 사건은 ‘선공격의 역풍론’을 증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밀하지만 강력한 ‘남한의 응징’
이진삼 대위의 작전은 단순한 첩보나 정보 활동이 아닌, 직접 사살·파괴를 단행한 실질적 군사 행동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과 정책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넘어설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남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위기 대응의 전략적 유연성과 작전 실행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준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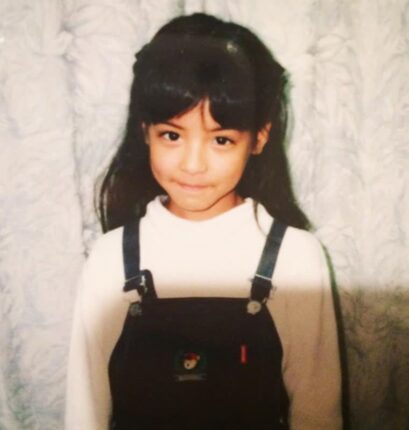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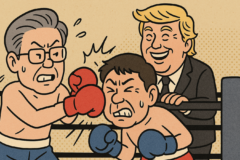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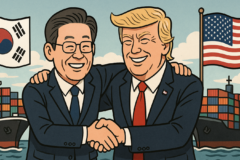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