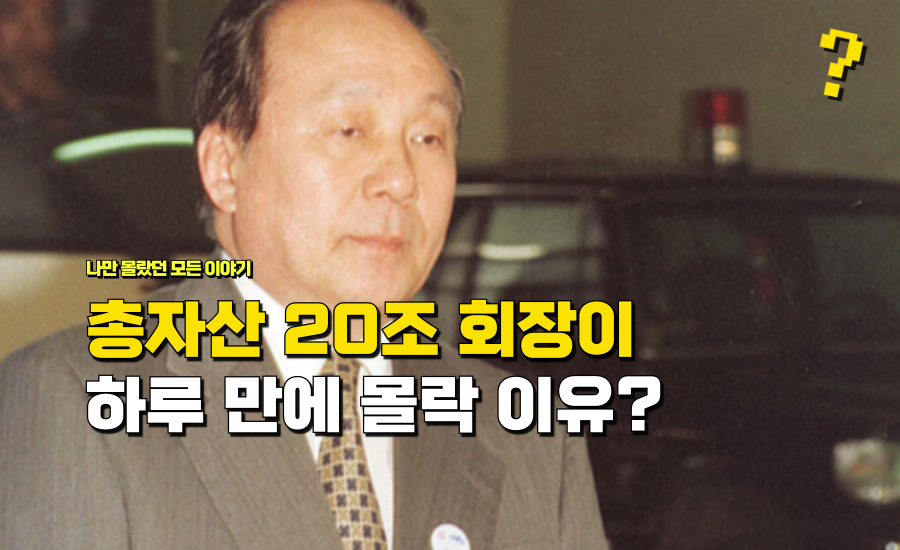
🏢 밀가루에서 63빌딩까지, 한 시대를 휘어잡은 재벌
신동아그룹은 1953년 조선제분을 인수한 최성모 창업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전쟁 이후 식량 공급이 시급했던 시기, 밀가루 산업은 절실했고 신동아는 이를 기점으로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후 금융업까지 손을 뻗으며, 1966년 신동아화재보험과 1969년 대한생명보험까지 인수하며 단숨에 재계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된다. 1985년에는 아시아 최고층이던 63빌딩을 완공하면서 ‘신화’라는 말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 밀가루 기업에서 금융·건설 대기업으로 급성장하며 63빌딩 신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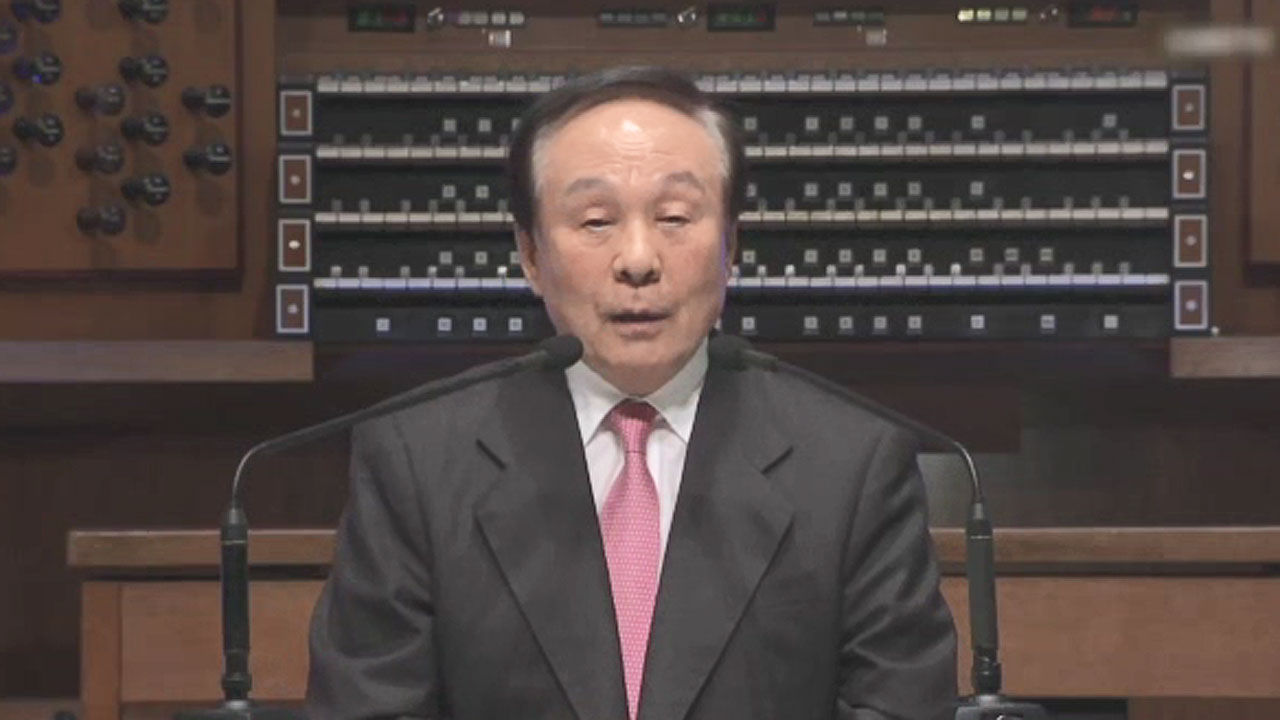
📈 총자산 20조, 재계 8위까지 오른 눈부신 전성기
1990년대 신동아는 총자산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한다. 특히 대한생명은 그룹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계열사였다. 매출은 연간 9조 원을 넘겼고, 금융·식품·화학·목재까지 전 산업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룹의 실질적 중심이 금융사였고, 다른 사업은 자금 뒷받침 없이 확장을 반복했던 구조였다.
📌 겉으로는 승승장구였지만, 내부는 불균형한 자산 구조에 의존

🚨 무리한 확장과 해외 투자가 부른 비극
1996년, 신동아그룹은 무역업에 뛰어들며 큰 투자를 단행했다. 최순영 회장은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외환 1억8천만 달러를 불법 대출받아 사용했지만, 실제로 유통된 돈은 2천만 달러뿐이었다.
남은 자금은 회계상 의혹을 남기며 수사를 받았고, 1999년 최 회장이 구속되며 그룹은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특히 핵심 계열사였던 대한생명의 부채가 자산보다 3조 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다.
📌 무리한 외화 차입과 부실 투자로 그룹 해체의 단초 제공

🗳️ 정치와 기업의 얽힌 말로… 불편한 진실
최순영 회장은 훗날 “DJ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아서 보복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정권 교체 이후 대한생명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는 그룹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1999년 8월, 대한생명은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동아제분은 사조그룹으로 넘어가며 ‘신동아’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정치와 기업이 맞물린 한국형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 정치적 리스크는 그룹 몰락의 결정적 방아쇠가 되었다는 평가

🧾 남겨진 자산과 사람들… 그리고 미납된 추징금
2025년 현재, 63빌딩은 한화그룹의 자산으로 편입되어 금융 중심의 랜드마크가 됐고, 동아제분은 ‘사조동아원’으로 사명을 바꿔 식품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룹을 이끌었던 최순영 전 회장은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는 현재 선교재단 활동 중이지만, 여전히 미완의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 자산은 살아남았지만, 인물은 빚과 논란의 중심에 머물고 있다

📚 거대 그룹의 몰락이 남긴 교훈
신동아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 과도한 금융 의존, 무리한 확장, 정치적 중립성 상실까지 한국 대기업의 그림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특히 63빌딩은 물리적 높이와 달리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보여주기식 개발’의 상징으로 남았다. 지금도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나 대기업 경영의 교훈으로 회자되며, ‘너무 빨리 커진 기업’이 어떤 파국을 맞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남아 있다.
📌 커진 만큼 위험도 커진다… 확장보다 중요한 건 ‘균형과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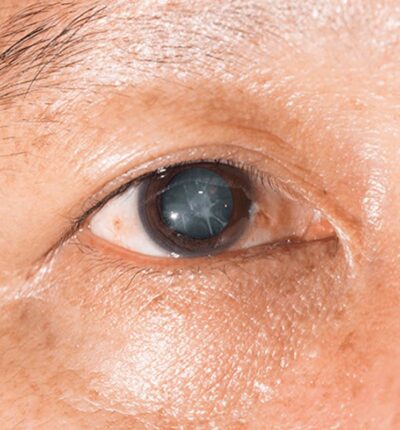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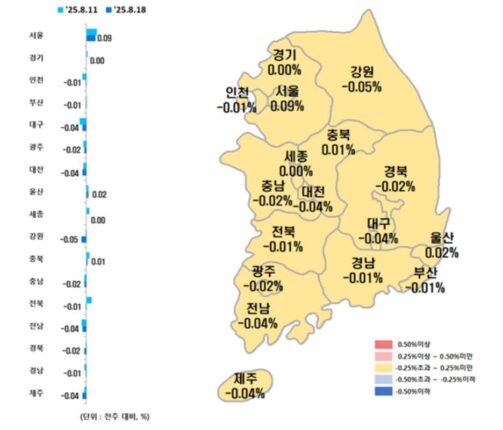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