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0년 묵은 ‘낙서’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 – 방구촌 암각화의 기적
202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방구촌 암각화’를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했다. 처음엔 단순한 낙서로 보였던 암각화가 유네스코의 엄정한 기준을 통과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7000년간 이어진 인간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단절 없는 기록, 시공을 넘은 흔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정치, 종교와 언어의 흐름. 방구촌 암각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신석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공동체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시간의 벽화’다.

세계가 주목한 유산, 암각화
방구촌 암각화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안리에 위치해 있다. 이 장소는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보통 바위그림이라 하기엔 숨 막힐 정도의 역사가 눌어붙어 있었다.
바위의 크기나 생김새보다 중요한 건 그 표면에 새겨진 수천 건에 이르는 글자와 상형 이미지다. 이는 단순히 고대 벽화 1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인의 흔적’이자 ‘집단 기억의 축적’이었다.
- 약 7,000년 전 신석기인의 불 사냥 장면
- 청동기 시대의 농업 무늬와 인물상
- 삼국시대 고구려 관료의 이름
- 신라 시대 왕의 행차 흔적
- 조선 후기 승려와 유학자의 글귀
- 2011년 기록된 고등학생의 이름 ‘이상현’
이 모든 글씨와 그림은 동일 장소의 바위에 시간 순으로 명확히 중첩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네스코가 ‘역사상 가장 긴 방명록’이라 평가한 이유가 되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닌 ‘기록의 타임라인’
방구촌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그림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이 장소에 이름을 남겼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유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시적인 특성을 가진다.
세계 각국에는 수천 년 전 유물은 많다. 단재 유물, 고분, 사원, 신전 등은 일관된 특정 시점에서 남은 과거이다. 하지만 방구촌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끊김 없이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남긴 흔적이 누적되어 있다.
바위의 위치(낙동강 상류), 교통·수로·식량·정보의 중심성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주요 교통 요충이 되었고, 문자가 생기기 이전 전시대의 흔적과 문자 등장 이후의 상징이 동시에 남게 되었다.

7000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유일한 장소
신석기~청동기 이미지
- 뿔 달린 사슴과 불 사냥 장면
- 곡식 수확과 천신(하늘신)의 제사
- 태양신, 초승달, 물결 교차 문양 등
삼국시대 기록
- 서기 453년으로 추정되는 ‘신라 왕자’ 혹은 지방관의 행차 관련 기록
- 고구려식 관직명 ‘대형(大兄)’이 등장, 이는 고구려-신라 간 관계사 분석의 결정적 사료로 활용됨
- 고대 시베리아 암각화 문양과 유사한 도상들이 남아서, 북방문화 전파경로 및 교류 양상 연구의 열쇠로 작용
고려~조선 후기
- 행군 중 들른 무신들의 이름
- 문사들과 승려들이 풍경을 찬미하며 남긴 한시
- 불경 문구와 유교 경전 문장의 혼재
현대 한글의 등장
- 2011년, 이 바위에 새겨진 한글 이름 ‘이상현’의 등장
- 이는 경찰 수사로 고등학생 A군이 친구 이름을 새긴 것으로 밝혀졌고, 일견 비판 대상이었지만 유네스코는 ‘인간 개인이 남기는 흔적의 연속성’에 주목해 긍정적으로 해석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진짜 이유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까다롭기로 정평난 유네스코는 방구촌 암각화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문자 출현 이전의 상징 표현 → 문자 생성 이후의 기록 체계까지 ‘단일 지형 안의 전환점’ 실존
- 동북아시아 7,000년 교류사 전체 압축
- 고대 북방민족(시베리아, 바이칼 지역)과 한민족 문화의 연장성 시사
- 한글이 현대 문화적 상징으로 암각화에 새겨진 세계 유일 사례
- 인간 집단 무의식, 고대 종교, 정치, 사회, 교육이 동일 장소에 축적된 세계적 유일 유산
유네스코는 이 유산이 “‘신들의 기록’이 아닌, 백성과 민중이 쌓아온 체온 있는 사료”로서 드문 인간사의 실마리라고 평가했다.

훼손은 있었으나, 가치는 되레 강해졌다
2011년 고등학생이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새긴 사건은 한때 ‘국보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록은 오히려 “과거와 현대가 직접 연결된 순간”으로 의미가 재해석되었다.
별 것도 아닌 낙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이름이 한국에서 창제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로 적혀져 있다는 점에서, 이 암각화가 ‘언어를 넘어선 시간의 책’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낙서’처럼 시작한 손끝의 역사, 그 끝은 세계유산이었다
7000년 전, 어느 무명 신석기인이 바위에 사슴을 새겼다. 453년엔 신라의 왕이 이름을 남겼고, 조선의 선비가 시를 쓰고, 2011년 한 고등학생이 친구 이름을 새겼다. 그것이 비난이든 채찍이든, 사람의 손으로 이어져온 이 감동스러운 흐름은 결국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로 완성되었다.
방구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 시대, 사회, 계층, 문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인간이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는가를 묻는 하나의 바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한 이유였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앞에 섰고, 누군가는 또 다른 시간의 해석을 남긴다. 7,0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건,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 아니라 ‘기록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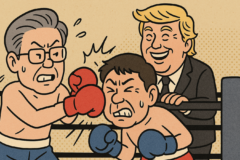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