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의 골드만삭스 될 줄 알았는데…” 1조 7천억 날리고 사라진 기업의 정체
한때 한국 금융업계를 주도하며 ‘CMA 신화’와 ‘소매시장 강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동양증권이 지금은 대중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1962년 일국증권으로 출발해 동양그룹에 인수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던 이 기업은 2013년 동양사태로 인해 투자자 4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안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전성기에는 금융 부문만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심 계열사 역할을 했으며, CMA 시장 점유율 1위를 장기간 유지하며 소매금융 강자로 불렸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양그룹과 증권 계열사의 약점이 드러났고, 결국 구조조정 실패와 무리한 확장이 겹치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 전성기, CMA의 신화와 금융 중심 그룹으로의 부상
동양증권은 1980년대 동양그룹 편입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전성기에는 CMA 상품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CMA는 곧 동양’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정도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공이 동양그룹의 전략적 선택, 즉 금융 중심의 계열사 확장에 기인했다고 분석한다. 그룹 전체 수익에서 금융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소매 금융에 강점을 둔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했다. 당시 회장이었던 현재현은 금융 중심 재편을 밀어붙이며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그 안엔 지나치게 금융에 기댄 취약한 구조가 도사리고 있었다.

⚠️ 외환위기 이후 드러난 구조적 한계와 오판
1997년 외환위기는 동양증권에 첫 번째 위기를 안겼다. 증시가 148거래일 동안 55% 이상 폭락하면서 동양증권의 주가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주인이 있는 기업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강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금융 부문에 대한 의존은 오히려 강화됐고, 단순했던 그룹 지배구조는 점차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바뀌었다. 이 시기에도 동양증권은 외형 확장을 지속했지만, 내부 체질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겉으로 보기엔 ‘성장 중인 금융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이 누적되고 있었다.

🧨 2013년 동양사태, 투자자 4만 명이 입은 1조 7천억 손실
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는 동양증권의 몰락을 확정지은 사건이었다. 2006년부터 이어져 온 그룹의 자금난은 2013년 들어 회사채와 CP의 대량 만기로 폭발했고, 이를 막기 위해 동양증권은 계열사들의 부실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했다. 문제는 이들 상품이 마치 안정적인 투자처인 것처럼 포장됐다는 점이다.
투자자 4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손실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부당 판매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공식 지적했으며, 이 사태는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다.

🧭 대만 유안타에 인수, 이름만 바뀐 ‘동양의 그림자’
동양사태 이후 동양증권은 대만 유안타금융그룹에 인수돼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재도약을 시도했다. 유안타는 아시아 전역에서 자산운용과 증권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로, 인수 당시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브랜드를 바꿨다고 신뢰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시절 쌓았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업계에서도 유안타를 ‘이전 동양증권’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했다. 현재 유안타증권은 중소형 증권사로 분류되며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의 지위를 되찾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 무너진 명가는 말한다, 시스템 없는 확장은 위험하다
동양증권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기업 몰락이 아니라 한국 금융산업에 던지는 구조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적시에 단행하지 못한 구조조정, 리스크 관리 부재, 그리고 감독기관의 무책임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특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품을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금융사와 감독기관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교훈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금융산업이 되새겨야 할 경고이자,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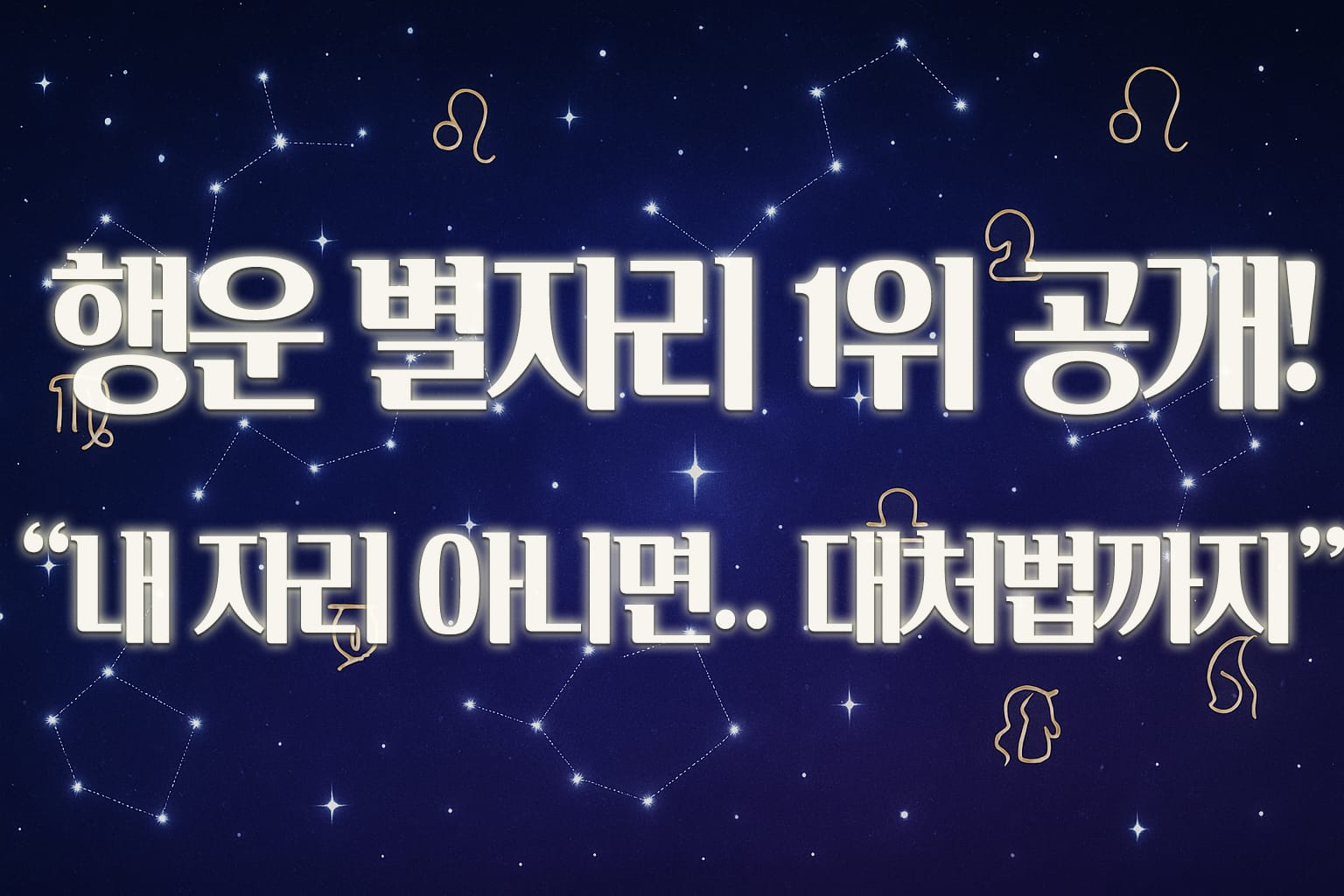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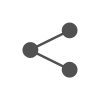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