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선업 재건 기회 앞두고 갈린 한국과 일본
미국이 거대한 조선업 재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손발을 맞춰 미국 본토에 생산 기지를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의 지원 전략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갈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경로 차이를 넘어, 국가 전략의 의지 여부 차이까지 드러낸다.

일본, 조선업 지원하라 하지만 기업은 ‘못 간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의 5,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 협력 제안 속에는 일본 조선사의 참여도 포함되었지만, 일본 최대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의 대표는 “현재 일본 점유율이 1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도울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 약속을 하고도 기업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 간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주저하는 현실적 이유
그렇다면 왜 일본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부정적일까. 첫째로 미국의 높은 인건비는 선박 가격을 크게 올리므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둘째로, 조선은 부품 10만~20만 개가 필요한 산업이며, 미국 내에는 아직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만드는데만 최소 5~10년이 소요된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수십 년간 위축된 조선 업계 입장에서 자국 산업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 깃발 꽂다
반면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과 기업들의 선제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미국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 정점은 2024년 12월 한화그룹의 필리 조선소 인수다. 이는 단순한 기업 M&A를 넘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단번에 확보한 쾌거였다. 일본에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일본이 나중에라도 배우게 될 한국 전략
한국의 신속한 미국 진출은 일본에게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국이 대신 짐을 들어주어 일본 정부의 외교 부담을 줄여준다. 둘째, 한국이 쌓은 진출 노하우와 공급망 리더십을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교본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선발주자가 길을 닦아놓으니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구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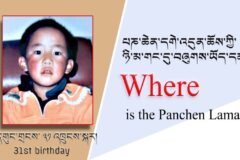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