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 스위치’ 논란, 실제로 있나?
최근 유럽 일부 언론에서 나온 ‘F‑35 전투기를 한순간에 셧다운 시키는 킬 스위치’ 이야기는 확실치 않다. 비주얼은 자극적이지만, 실제로 미국은 버튼 하나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복잡한 유지보수 및 보급 통제를 통해 사용 국가의 F‑35 전력 운영을 강력하게 좌우할 수 있다. 즉 킬 스위치가 아니라 전력화의 클릭을 멈추는 공급망 조절 권한이라 보는 게 더 낫다.

공급망 거부만으로도 속수무책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고도의 전자·네트워크 기술이 통합된 시스템이기에 미국이 통제하는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비 부품, 운용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전투력은 전무해진다.

비행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런 구조적 통제는 킬 스위치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강력하다.

미국과 적대할 경우, F‑35는 무용지물
이런 구조적 통제 권한은 사실상 수출국이 미국과 적대 관계로 전환하면, F‑35 조차 더는 쓸 수 없게 만든다는 경고 장치로 작용한다.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고 다른 국가, 특히 안보적 적들과 결탁하려는 경우, 운용 통제와 전략적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군사적 거래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존성으로서 디펜스 외교 구조를 반영한다.

킬 스위치 논란보다 더 중요한 대비
물론 버추얼 킬 스위치 논란은 언뜻 자극적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F‑35의 전체 운용 체계를 관리하는 구조다. 예비 부품이 부족해도, 네트워크가 끊겨도, 정비 루틴이 어긋나도 전투력은 하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미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자국 독자 비상 작전 체계, 장기 정비 계획, 예비 부품 조달 협력 강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킬 스위치라는 자극보다 더 깊은 고민 필요
결국 F‑35 도입국은 킬 스위치라는 개념보다 운용 주권을 유지하는 시스템 구성과 협약 조건이 핵심이다. 한국 역시 F‑35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단순 기술 수입을 넘어 운용 자율성과 공급망 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 억제력 확보가 진짜 의미 있는 전략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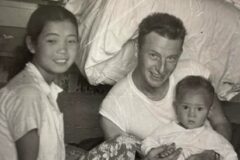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