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특이한 콘텐츠로 여겨졌던 ‘먹방’ 영상은 이제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대중적인 카테고리 중 하나다. 혼자서 쌓아놓은 음식을 폭풍처럼 먹어치우거나, 고급 요리를 맛있게 시식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 영상들은 많은 이들에게 시청각적 쾌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정신의학 연구에서는 ‘먹방 영상 과도 노출이 오히려 우울감과 정서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왜 우리는 남이 먹는 장면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

뇌는 ‘먹는 장면’만 봐도 도파민을 분비한다
먹방의 인기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군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볼 때 실제로 먹는 것과 유사한 보상 회로를 자극받는다. 이는 거울뉴런 시스템(mirror neurons)이 작동하면서 감각적 공감이 일어나고,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극이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인위적 보상이라는 점이다. 반복적으로 먹방을 시청할 경우 뇌는 점차 실제 음식 섭취보다 시청을 통해 보상받는 구조로 적응하게 되며, 이는 현실의 식사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점점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비교 심리가 불러오는 자기비하와 소외감
먹방은 대개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살이 찌지 않는 몸매를 가진 사람이 즐겁게 먹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나는 이렇게 못 먹는다’, ‘나는 저렇게 즐기지 못한다’는 비교 심리에 빠지기 쉽다. 특히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먹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비하, 좌절, 사회적 고립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우울 증상의 전형적인 심리적 경로다. 실제 연구에서도 먹방 시청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식이장애나 정서불균형 위험이 높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가짜 친밀감’이 정서적 결핍을 강화시킨다
많은 이들이 먹방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외로움 해소다. 특히 1인 가구나 대인관계가 단절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먹방을 통해 식사를 함께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얻는 유대감과는 전혀 다르다. 먹방은 일방적인 시청자-콘텐츠 관계일 뿐이며, 정서적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짜 친밀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진짜 관계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둔화되고, 사회적 회피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결국 먹방은 정서적 허기를 잠시 달래는 대신, 근본적인 고립감을 더 깊게 만든다.

식습관 왜곡과 실제 섭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먹방 시청이 직접적인 우울증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식습관의 왜곡과 뇌의 보상 체계 재편성이다. 먹방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고지방, 고열량 음식에 대한 시각적 반응이 과도해지며, 이로 인해 야식 충동, 폭식 행동, 과식 후 자책 같은 섭식장애 초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식사를 ‘필요’가 아닌 ‘보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식사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려는 패턴이 형성되기 쉽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울과 체형 불만족, 자존감 저하를 동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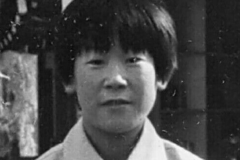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