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이나 고수를 싫어한다고 하면 흔히 “편식”이나 “어릴 때 안 먹어서 그렇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하지만 단순한 기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고수를 먹으면 비누 같고, 오이는 풀 냄새보다 쓰고 이상한 맛이 난다는 이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오이나 고수 특유의 향은 상당히 복합적인 식물성 화합물에서 비롯되며, 특정 사람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라, 뇌가 그 향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이런 차이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고수 혐오,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깊다
고수(실란트로)를 ‘비누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10~20%가량 존재한다. 특히 서구권에서 이 비율이 높으며, 아시아권 일부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과 23andMe의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OR6A2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OR6A2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의 하나로, 알데하이드류 성분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기능을 한다.

고수에는 ‘데세날’이라는 알데하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실제로 비누향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고수 속 알데하이드를 과도하게 감지해 비누와 같은 이질적인 향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후천적 노력으로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감각의 문제다.

오이 싫어하는 이유도 유전자와 연관된다
오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고수처럼 ‘비누 맛’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유의 쓴맛과 향을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오이에 대한 반감도 유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TAS2R38이라는 쓴맛 수용체 유전자가 주목받고 있다. TAS2R38은 쓴맛을 인식하는 데 관여하며, 특정 변이를 가진 사람은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뿐 아니라 오이의 피크린과 같은 성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오이의 껍질과 씨 부분에 있는 피크린(picrin) 성분은 특히 이 유전자 변이 보유자에게 더 강한 불쾌감을 준다. 이는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닌, 미각 수용체 단백질의 구조 차이에 따른 생리적 반응이다.

향과 맛은 뇌에서 결정되는 ‘감각 해석’이다
우리가 느끼는 맛과 향은 단순히 입과 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각으로 변한다. 오이나 고수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은 사람마다 그 수용체의 민감도 차이로 인해 다른 강도로 감지된다. 고수의 향을 신선하고 상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소독약이나 비누 같은 자극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감각 정보는 후각과 미각 수용체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돼 뇌의 특정 부위에서 통합 처리된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수십 종에 이르며, 개인의 유전적 배열에 따라 특정 향에 대한 거부감이나 호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같은 식재료를 두고도 ‘맛있다’와 ‘도저히 못 먹겠다’는 극단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뇌와 유전자에 있다.
- “매일 30초면 됩니다..” 노년 건강한 몸짱 바로 만들어줍니다
- 몸 안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 매일 쓰는 이 조리도구에서 시작됩니다
- 빨래할 때 ”이걸” 넣어보세요, 평생 다리미가 필요 없어집니다.
- 혀에 ‘이게’ 보이면 바로 병원 가세요. 위장까지 망가집니다
- 아침밥 대신 “이것” 먹으면 혈관 노폐물 제거되서 건강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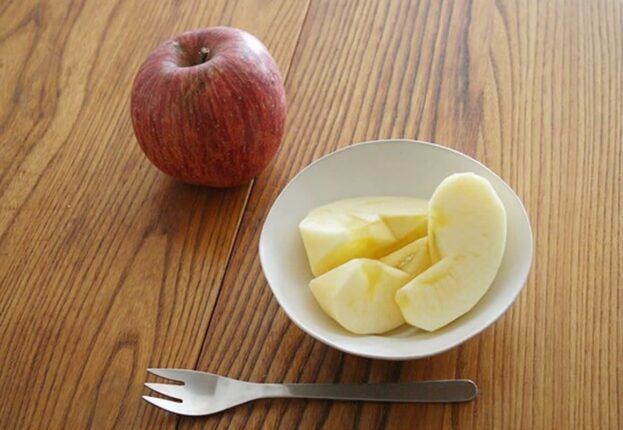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