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을 구부리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학계의 시선이 쏠렸다. 오랜 세월 수수께끼였던 번개의 발생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실마리로 기대를 모았다.
스페인 카탈루냐나노과학나노기술연구소(ICN2) 및 중국 시안교통대,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실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질에 힘이 가해져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압전 효과라고 한다. 수정 등 특정 물질에 압력을 주면 전하가 생기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물 분자는 전기적 편향(극성)을 가지지만, 얼음 결정은 전체적으로 극성을 서로 무마하는 구조다. 압력을 가해도 압전 효과는 나타나지 않다. 다만 재료를 변형하면 전기 분극이 유기되는 플렉소일렉트릭 효과(flexoelectric effect)는 물질의 대칭성과 무관해 어떤 물질에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얼음의 플렉소일렉트릭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실험에 나섰다. 우선 초순수를 금 또는 백금으로 코팅한 알루미늄박 사이에 넣고 약 -20℃에서 얼려 두께 1.8~2.2㎜의 얼음 콘덴서를 만들었다. 이를 동적 점탄성 측정기(DMA)에 설치하고 삼점굽힘을 가했다.
이때 중앙의 처짐(변형량)을 변위센서로 측정하면서 압력에 의한 미소 전하를 증폭했다. 발생하는 양자는 오실로스코프로 동기화하는 한편, 얼음의 휘는 정도와 그로 인한 전기적 분극의 관계를 해석했다.
그 결과, 얼음의 플렉소일렉트릭 계수는 센서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스와 맞먹었다. -25℃보다 온도를 높이자 얼음의 녹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유사액체층이 나타났다. 이것이 플렉소일렉트릭 효과를 급속히 끌어올려 얼음이 쉽게 변형됐다.
온도를 -70℃ 이하로 낮추자 플렉소일렉트릭 효과가 다시 상승해 -113℃에서 정점을 찍었다. 스토니브룩대 페르난데즈 세라 연구원은 “얼음이 -113℃ 이하에서 그 표면에 강한 강유전성(외부 전기장 없이 전기 분극이 발생해 이를 외부로 반전하는 성질) 층을 갖는 것을 알아냈다”며 설명했다.

이어 “원래 얼음 내부는 강유전성을 띠지 않지만 실험 속 현상은 얼음 표면 수십㎚(나노미터)의 아주 얇은 표층에서만 일어나는 표면 강유전성”이라며 “전극의 금속을 변경해 검증한 결과, 역시 얼음 표면에 강유전성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얼음이 -70℃ 이하에서는 강유전성, -25℃ 이상에서는 플렉소일렉트릭 효과를 보이면서 전기가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구름 속에서 일어나는 얼음 알갱이 충돌을 모델링해 플렉소일렉트릭 효과에 의한 전하량을 계산한 연구팀은 충돌 시 얼음 알갱이가 크게 변형되면서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도 알아냈다.
페르난데즈 연구원은 “압전성이 없는 얼음이 왜 충돌에 의해 대전되는지 오랜 세월 학자들은 알지 못했다”며 “우리 연구는 뇌우 속의 얼음 알갱이들이 번개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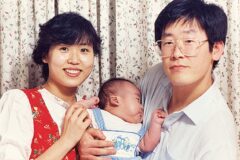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