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우리는 안전해졌을까?

지난해만 해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핼러윈 축제로 유명한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는 믿기 힘들 정도다.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사회.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나라가 돼 버렸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는 불행한 사고들도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숨졌고, 2018년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45명의 목숨을 잃었다. 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 화재로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안하다.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처를 보듬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10년 전인 2014년 4월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다. 세 차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비롯해 특검, 검찰특별수사단까지 주체를 바꿔가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일부 의혹을 밝히고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들을 단죄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사회적 비용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그날의 총체적 진실은 여전히 미궁이고 이를 규명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한다. 유가족들의 주장에 피로감을 느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뾰족한 해결책 없는 ‘정치적 담론’으로만 남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월호에 대한 안전 대책도 달랐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안전을 관할하는 조직의 명칭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고 원인을 파악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시간에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 채 공방만 계속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안전사고에 대해 최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게 한 게 국회 아닌가? 정부도 정치인도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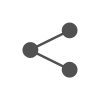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