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눈은 또렷해 보이는데, 부르는 소리에는 반응이 없고, 손을 휘적거리다 멈춘 채 한참을 같은 자세로 머무르기도 한다.
많은 부모들은 이걸 그냥 “아기니까 그럴 수 있지” 혹은 “세상을 배우는 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행동일 수 있다.
이 행동, 알고 보면 ‘소아결신증후군(Absence Seizure Syndrome)’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
‘잠깐 멍~’은 그냥 멍이 아닐 수 있다
소아결신증후군은 일종의 비전형적 간질로, 영유아기에 발병하기도 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겉보기에 경련이나 발작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갑자기 의식이 멈춘 듯한 상태가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반복된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한곳을 응시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거나 반응이 없다
손을 쥐고 펴는 행동이 반복되다 갑자기 멈춤
입술을 씹거나 빠는 듯한 습관적인 입놀림
눈꺼풀이 빠르게 떨리거나 깜빡임이 잦음
증상 전후로 기억이 없고, 금방 다시 평소처럼 행동함
문제는 이런 행동이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 “그냥 아기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넘기게 된다는 것.

진짜 무서운 건 ‘조용한 발작’이다
결신증후군은 외형적으로 드라마틱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간질’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이 발작이 하루에도 수십 번, 심한 경우 수백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신생아나 생후 3~12개월 아기에게서 처음 나타날 경우,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 발달 지연, 주의력 장애, 학습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멍 때리기’와의 구분법
신생아도 가끔 집중하거나 피로할 때 잠시 멍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아결신증후군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아기들에게 자주 놓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결신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도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너무 ‘정적’이다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잠깐 멍하게 있는 모습이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학적 접근 우선
일부 부모는 아기가 ‘기운이 약한가 보다’ 혹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듯’하며 한약을 먼저 찾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한 원인 확인이 우선이다.

이런 행동이 보이면 꼭 병원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아신경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 뇌파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멍한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하루 중 빈도가 늘어난다
반응 없는 행동이 일관되게 같은 패턴이다
평소에 비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부쩍 많아졌다
아기가 이유 없이 자주 놀라거나 움찔한다
뇌파 검사(EEG)를 통해 결신 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라면 약물로 안정화가 가능하다.

이런 일상 습관으로 부모가 먼저 체크할 수 있어요
눈 맞춤이 자연스러운지
아기를 안고 부를 때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는지 살펴보세요.
손발 움직임이 갑자기 ‘정지’되진 않는지
장난감을 잡고 놀다가 갑자기 뚝 멈추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기록해 두세요.
수유 중 ‘공백’이 있는지
젖병을 물다가 갑자기 입을 멈춘 채 응시하거나, 빠는 동작이 멈추는 경우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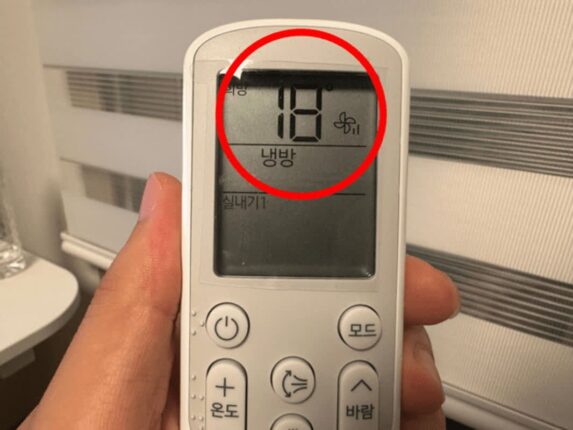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