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손이 간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한두 잔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반복된 음주는 결국 의존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술을 강력하게 보상 자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미국 UC 샌프란시스코 신경과학 연구진은 알코올이 뇌 안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중독을 유도하는 구조를 명확히 밝혔다. 결국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뇌가 술을 좋아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멈추기 어려운 것이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이 뇌의 특정 부위인 측좌핵(nucleus accumbens)과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에 작용해 엔도르핀을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엔도르핀은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흔히 운동이나 웃음,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비되지만, 알코올은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 자극을 강화시킨다.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는 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라 뇌에서 엔도르핀이 실제로 증가하면서 뇌가 즐거움을 학습한 결과인 셈이다.

반복적으로 마시면 뇌가 ‘보상 회로’를 기억하게 된다
문제는 이 쾌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코올에 의해 엔도르핀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뇌는 ‘술=보상’이라는 공식을 학습하게 되며, 반복적 음주를 통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중독의 보상 회로 형성이라 부르며, 도파민 시스템과 함께 작동해 술을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한 갈망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특히 뇌의 전전두엽이 알코올로 인해 장기적으로 억제되면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져 ‘알면서도 또 마시게 되는 상태’로 이어진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음주를 기본 반응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엔도르핀 중독은 도파민보다 더 무섭다
보통 중독 얘기에서 도파민만 언급되기 쉽지만, 엔도르핀은 신경계에 더 깊고 느리게 작용해 끊기 어려운 정서적 중독을 유발한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상황을 무디게 만들고, 사람을 평온하게 만드는 진정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안정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술을 찾게 되는 조건반사형 행동을 보인다.

이때 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이 있어야 같은 정도의 엔도르핀을 분비하므로 음주량이 점차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 술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술이 당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엔도르핀 중독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뇌 구조를 바꾸려면 강력한 외부 자극이 필요하다
이미 술에 길든 뇌를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하다. 엔도르핀을 자연스럽게 분비할 수 있는 건강한 자극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 햇볕 받기, 음악 듣기, 명상, 사람과의 교류 등은 뇌에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또한 음주 욕구가 올라오는 상황을 피하거나,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대체 행동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뇌는 새롭고 더 강한 자극에 반응해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끊으려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뇌를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지속적인 절주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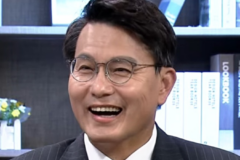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