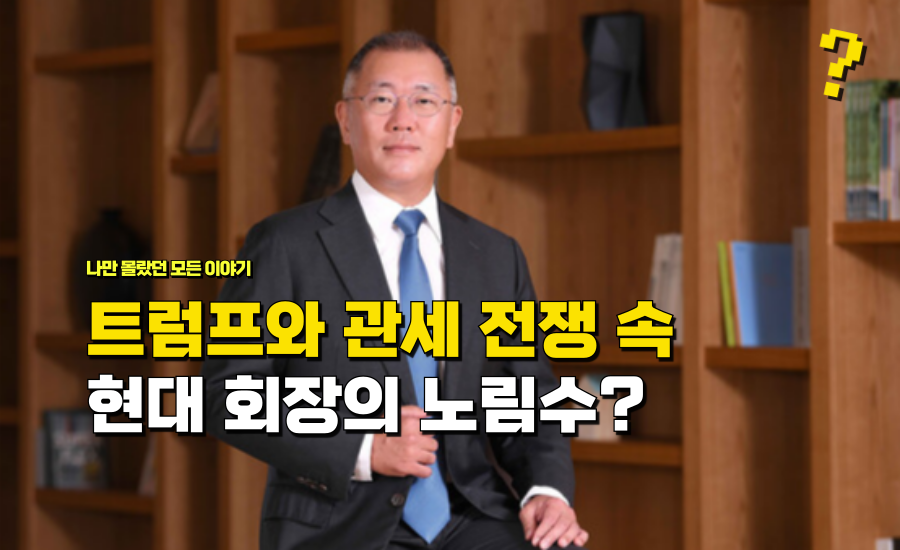
🇺🇸 ‘트럼프발 관세’ 직격탄, 자동차 산업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 정책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재편과 수출 전략 수정에 돌입했지만,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
현대차그룹 역시 이 파고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관세 부과 이후 국내 생산기지는 수출 타격을 받았고, 특히 멕시코 공장은 생산량이 줄며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 생산은 줄었지만 판매는 견고… 현대차의 이례적인 흐름

🔧 정의선의 ‘위기 대응 TFT’, 미국을 정면돌파하다
관세 파장은 단순한 수출 지연을 넘어, 글로벌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였다. 정의선 회장은 위기 대응 조직인 ‘관세 대응 TFT’를 직접 가동하고, 수익성과 지역별 생산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는 데 착수했다.
특히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전기차 중심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대한 설비 효율화가 핵심 조치였다. 부품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고, 미국 정부의 관세 완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 미국 현지 생산 최적화 + 부품 조달 현지화로 비용 흡수

⏱ 관건은 재고 소진 이후… 가격 인상이 현실로
현대차그룹은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내 보유 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6월 이후엔 관세 부담이 그대로 차량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북미 총괄 사장은 가격 동결을 선언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신차 가격이 향후 6~12개월 사이 최대 570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 가격 인상 불가피, 수요 감소 대비한 마케팅 전략 병행 필요

⚠ 글로벌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한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줄고 있으며, 북미 지역은 9%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비중 확대가 주효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친환경차 판매량이 21만 대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38% 급증했다.
🔋 친환경차 중심 구조 전환, 고수익 모델로 수익성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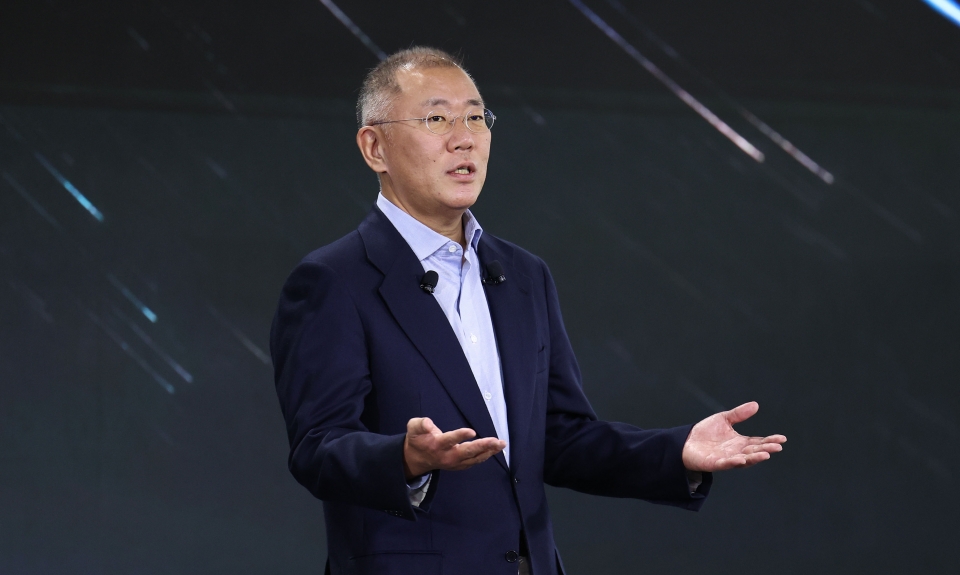
🤝 외교적 해법도 기대… 영국 사례 주목
최근 미국이 영국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을 통해 조건부 인하를 결정한 것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신호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 10만 대 한도에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실무 협의에서도 비슷한 ‘스왑 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나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식 협상의 유연성이 한국에도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 한미 무역 협상의 유연성 주목, 관세 조정 여지도 생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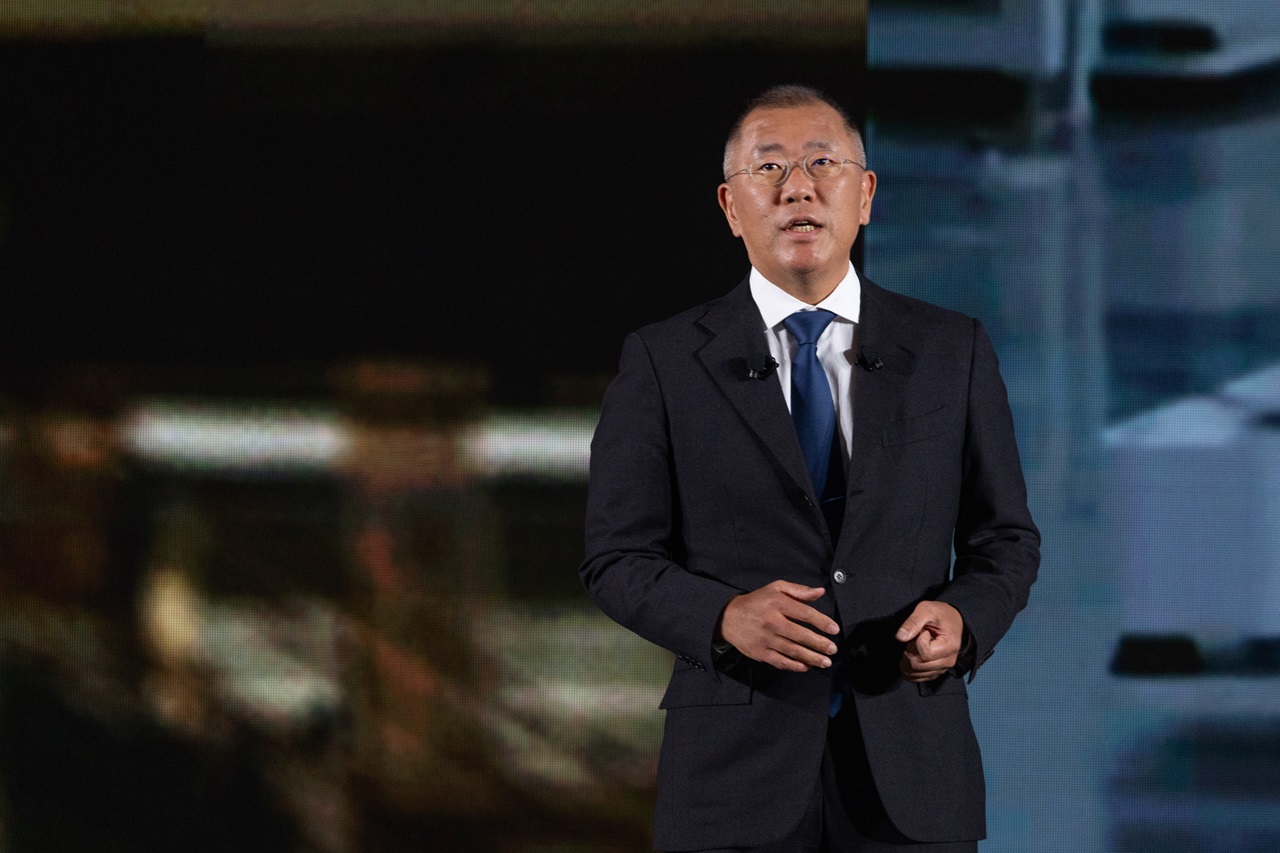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의선의 ‘멀티 플랜’
정의선 회장은 단순히 위기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관세라는 외부 충격을 기회로 삼아 생산 체계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
울산공장의 특근 확대, 앨라배마 공장 전환 속도 가속, 전기차 기반 확대 모두 관세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복합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어가며 ‘기적의 생존’을 보여주고 있다.
📈 규제 속에서도 탄탄한 대응… 위기를 넘는 한국차의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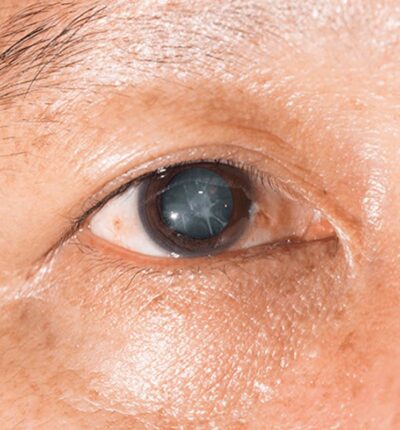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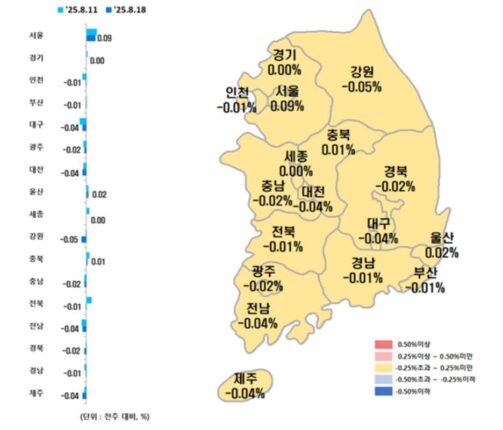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