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아이는 배고픔과 상관없이 음식을 반복적으로 찾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흔히 ‘강박적 섭식’으로 불리며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들은 우울, 불안,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정서 불안과 먹는 행동의 관계
아이들은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행동으로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을 경험할 때 음식 섭취가 일종의 위안이나 보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습관화되면 아이가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음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충동 조절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
강박적 섭식은 단순히 배고픔에 의해 조절되는 행동이 아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뇌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충동 조절 능력이 미숙한 아이는 ‘먹고 싶다’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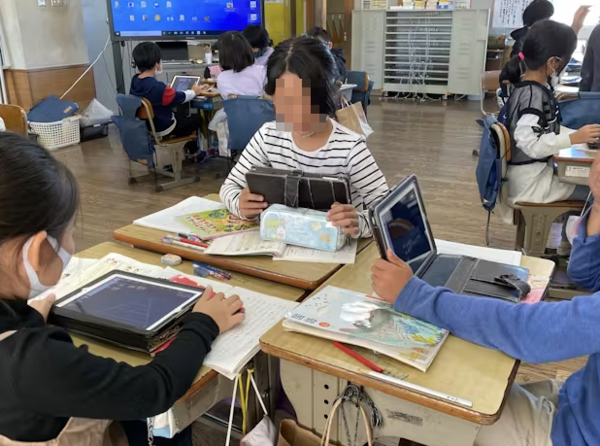
이는 단순히 식습관을 넘어, 장기적으로 학업 태도나 대인 관계에서도 충동적인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강박적 섭식은 뇌 발달과 자기조절 능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강박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만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자신감 저하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성장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고착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질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아이의 먹는 행동을 단순히 ‘잘 먹는다’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지원과 관리
강박적 섭식을 보이는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 양을 제한하기보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음식 이외의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놀이 활동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큰 차이를 만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음식을 즐기되, 감정과 행동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댓글0